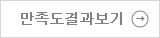순천만 갈대의 특성
97년 15만평이던 갈대숲이 지금은 70만평으로 더 늘어났다.
“순천 시내에서 흘러든 하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갈대가 급속하게 퍼져나간 거죠. 그렇다고 갯벌이 오염된 것이 아닙니다.
갈대가 수질 정화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전 하수처리장이 생겨 이제 갈대밭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퇴적층이 쌓여 염습지가 생기면 갈대나 함초 같은 습지생물이 군락을 이룬다. 그 너머로 갯벌이 생기고, 다시 갯벌은 모래밭으로 바뀐다. 순천만은 바로 이런 갯벌 발달의 전과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한다.
외국의 지질·지리관련 연구자들까지 순천만을 찾는 까닭이다. 둥글둥글 갈대밭 순천만 갈대밭을 한눈에 내려다보려면 해룡면 농주리 용산에 오르면 된다. 바다를 마주한 야트막한 산. 들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쓰는 오리농장이 들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만 워낙 경관이 좋은 까닭에 사진작가들이 자주 찾는다.
수로를 따라 형성된 갈대밭은 옛날부터 있던 갈대밭이다. 갈대씨가 바람을 타고 갯벌 한가운데까지 날아와 뿌리를 내린 새 갈대밭은 원형 모양으로 번식하고 있다. 마치 세포분열을 하며 증식하는 원생동물처럼 ‘O’자의 갈대숲이 커져나가 서로 합쳐지면서 갈대숲이 커져가는 것이다. 갈대는 한때 마을사람들의 수입원이었다.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갈대를 꺾어 인삼밭의 차양막으로 내다팔았다. 빗자루를 만들기도 했고, 땔감으로 쓰기도 했다. 갈대 뿌리가 항암작용을 한다고 해서 캐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80년대 들어 형편이 나아지면서 갈대밭에 인적이 끊겼고, 무성해진 갈대밭으로 철새들이 날아들었다.
갈대숲에는 벌써 겨울철새가 찾아왔다. 민물도요새가 떼를 지어 비행을 하고,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가족이 갯벌밭에 앉아 쉬고 있다. 처음 순천만은 철새 때문에 알려졌다.
순천만에서는 우리나라에 사는 텃새와 철새 400여종 중 절반 가량을 만날 수 있다. 이중 겨울철새는 모두 40여종. 10월 말 10여마리였던 흑두루미는 11월 중순 150여마리까지 늘었다. 97년 59마리가 관찰됐는데 3배나 늘어난 셈이다.
2020년 7년만에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 한마리가 발견됐다. 천연기념물 201호 고니는 8마리, 205호 저어새는 4마리가 보인다. 검은머리 갈매기도 요즘 100여마리가 머물고 있다. 전세계에 5만마리 정도 살고 있다는 혹부리오리는 1월쯤 5,000여마리가 날아온다. 또 봄·가을에는 1만5천여마리의 도요새를 볼 수 있다.
갈대숲을 끼고 있는 대대포구는 쇠락한 옛 포구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한때는 일본을 오가는 고깃배가 많이 드나들었던 곳. 이제는 고깃배 몇척이 드나들 뿐이다. 2020년 8월부터는 관광안내선 3척이 관광객들을 실어나른다.